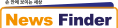요즈음 나에게는 아카시아 꽃잎이 떨어지는 닭장에서 아침마다 계란을 꺼내오는 작은 기쁨이 있다. 기르는 닭이 7마리인데 암탉 여섯 마리에 수탉이 한 마리이다. 매일 4-6개의 알을 갖고 나오는데 입가에 미소가 절로 생긴다. 손주 녀석 먹일 것이고 적어도 이것은 도회사람이나 보통사람들이 쉽게 못 구하는 유정란 이기에 비록 마트에 가면 많이 팔지만 너무나 소중하다.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는 엄청나다. 오랫동안 닭을 치며 경험 한 바에 의하면 냉장고에 내가 기른 닭의 유정란과 마트에서 구입한 일반 계란을 두고 3년 정도 보관 했다가 깨어보니 유정란은 노른자 그대로 수분만 증발하여 딱딱하게 굳어있어 개사료로 먹일 수가 있었고, 마트 계란은 까맣게 썩어서 말라있거나 썩은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닭과의 인연을 맺은 것은 시골로 이사를 내려온 중 1때부터 시작되었다. 닭뿐만 아니라 토끼며, 염소, 개, 돼지까지 다양한 가축들을 길렀다. 5.16군사 혁명이후 국가재건(國家再建) 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라 아침마다 “둥 둥 둥 휘날리는 재건의 깃발아래서~” 로 시작되는 재건가(再建歌)를 부르며 모두가 바삐 움직였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부업을 장려 하던 시절이라 어느 집이던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경제중흥의 태동기였으며 이후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겨울이 채 가시기 전 어느 날 부업을 하시겠다며 병아리 100마리를 분양 받아오셨다. 어머니께서는 난리가 나셨고 한 10여 마리를 키워보고 수를 늘리던지 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 많은 닭을 어쩌려고 가져왔냐며 대놓고 말은 못 하시고 종일 중얼 거리셨다. 결국 빈방하나를 손 보아서 전등을 두어 개 낮게 달고 백촉(100W)짜리 전구를 상자에 넣어 발열 장치를 만든 다음 병아리를 풀어 두었다. 품종은 알을 많이 낳는 레그혼 보다 보기가 좋고 등치가 큰 미종(정확하지않음)이라 하셨다.
한 일주일간은 열심히 병아리를 돌보신 것 같다. 아버진 여기까지셨다. 원래 잔손질 하실 줄 모르시고 못하나 제대로 박을 줄 모르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던가, 결국은 어머니의 몫, 병아리가 조금씩 자라면서 일은 많아졌다. 사료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지금처럼 사료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앗간에 가서 미강(부드러운 쌀겨)을 사온다음 조개껍질을 빻아 함께 이긴 것을 사료로 만들어 주어야 했고 시장에 가서 생선 내장 같은 부속물을 사와서는 삶은 다음, 사료와 섞고 채소 잎 등을 잘게 도마질하여 혼합 사료를 만들어 주어야 했다.
지금처럼 차가있는 것도 아니니 방앗간이며 시장에 다녀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다. 드디어 닭이 방을 나와야 할 즈음 아버지는 이번엔 제법 큰 중돼지 새끼를 사오셨다. 급조한 우리에 돼지를 가두어두니 일은 점차 커졌다. 이 역시 어머니의 몫으로 고스라니 돌아갔다. 체격이 작고 처녀적에는 일을 해보지 않고 곱게 살아오신 어머니에게는 가혹할 정도의 부담이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돼지가 있으니 역시 사료와 돼지우리에 깔아줄 볏짚이 필요했다. 그래서 결국 논을 구해서 논농사까지 짓게 되었으니 점입가경(漸入佳境)이요 첩첩산중(疊疊山中)이었다.
어려서 몰랐지만, 이때 어머니는 막내를 임신하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다. 어머니 나이가 마흔이셨으니 애기 가진 것이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하시지 못하고 혼자만 고민하고 계셨던 모양이다. 막내는 나하고 띠 동갑이니 어머니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 하셨을까.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하니 자연스럽게 일들은 어린 내 몫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니 어떻게 하던 어머니를 돕고 싶던 생각뿐이었다. 10리밖에 있는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달려오기 바쁘고 집안일 돌보기에 정신이 없었다. 닭과 돼지 먹일 풀베기와 이웃의 구정물(쌀 씻은 뜨물) 걷어오기에 오후시간을 보내야했다. 막내 여동생이 태어나고서는 애기보기까지 내 몫으로 돌아왔다. 똥 귀저기 빨래하는 것도 알아서 해내어야 했다.
그런데 닭들이 점차 자라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자기들끼리 서로 쪼아 위장을 뜯어내거나 항문을 쪼아 창자를 끄집어내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자라면서 약한 동료나 몸에 이상한 것이 붙어 있거나하면 줄기차게 그놈만 쪼아댔다. 요즘말로 왕따에다.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학교에 다녀오면 창자를 꽁무니에 달고 피해 다니는 녀석들을 돌봐야하고, 위장을 뜯겨 모이가 흩어 내리는 녀석을 처리해야하는데 어린 내가 어디에 물어볼 때도 없었을뿐더러 당황스럽기만 했다.
창자가 빠진 녀석은 결국은 죽어나갔고, 위가 뜯긴 녀석들은 바늘과 실을 가져와서 기워주고 머큐럼을 발라 주는 것이 최선이었다. 소위 외과 수술을 집도한 셈이다. 그중 몇 마리는 살았으나 위장과 가죽을 같이 꽤 매어서 그런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왜소한 상태로 살아갔다. 헛간에다 닭장을 새롭게 만들어 닭을 옮기고 알을 낳기 시작할 무렵 어느 날이었다. 새벽에 헛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아버지는 우물이 바로 옆에 있으니 물을 길어 불을 끄면 될 것을 곤히 새벽잠을 자는 내 이름만 불러댔다. “종진아, 종진아, 불났다”하시면서 말이다. 다행히 초가이던 헛간은 반쯤 타다 불길이 잡혔다. 그러나 놀란 닭들은 혼비백산해 여기저기로 흩어져 몇 마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우여곡절을 격고 생존한 닭 60여 마리가 알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알의 처리가 또 문제였다. 팔려고 다니기도 힘들었고, 결국 계란은 한 대야씩 쌓여 갔다. 간혹 누가 오면 한 알에 당시 돈으로 5원 또는 7원에 가져갔다. 미강 한 가마니 값도 안 되는 돈이 남았다. 인심 좋은 어머니는 아무나 오면 계란을 한 바가지씩 담아 나눠 주었다. 심지어 거지가 와도 계란을 주어 보냈다. 읍내 장에 있는 가계에 가져다주면 약간의 돈이 되었겠지만 어린 애기를 업고 무거운 계란을 이고지고 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루에 수십 개씩 생산되는 계란이 골칫거리가 되자 아버지는 드디어 큰 결심을 하셨다. 닭을 살(殺)처분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나에게 특명이 떨어졌다. 하루에 한두 마리씩 마음대로 잡으라는 것이다. 아버지 앞에 “못하겠다”는 말대꾸는 일체 용납이 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이를 실행하게 되었는데 닭을 잡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모가지를 비틀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힘들다. 닭은 큰데 손은 조그만 중학생이 비틀고 몸부림치는 놈을 제압하기에는 여간 어렵지 않았다. 다음은 물을 끓여 담궜다가 털을 뽑는다. 가슴 털은 쉽게 뽑혀도 꽁지 깃털과 날개의 깃털은 잘 안 뽑힌다. 물의 온도도 잘 맞아야하고 특히 겨울에는 손이 많이 시려 고생했다. 해체작업은 요령이 있으면 되지만, 비위역시 좋아야한다.
아버지는 내장과 똥집을 좋아하셔서 이것을 뒤집고 청소한 다음 소금으로 빡빡 씻어 두어야 냄새가 안 나고 맛이 좋았다. 참고로 닭발도 잘게 도마질하여 참기름 소금장에 먹으면 일품이었다. 철모르는 어린 시절은 사춘기가 뭔지도 모른 체 이렇게 훌쩍 지나버렸고 친구들이 여드름 짜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야심차게 시작된 우리 집의 재건 양계사업은 이렇게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살생유택(殺生有擇)이니 하는 철학적 개념을 어렴풋이 생각하게된 중3 무렵 드디어 닭도 남은 것이 없어졌고, 닭 해부(解剖)의 전문가(專門家)가된 내 손기술만 남게 되었다.
배종진 | 향토사학자·문화재청 방문교사·예비역 포병장교
관련기사
- [대한민국 성장사 ㉒]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 [대한민국 성장사 ㉑ ] 등골 오싹한 상가조문
- [대한민국 성장사 ⑳] 거칠게 생긴 사람과 사는 것이 소원
- [대한민국 성장사 ⑲] 호박장군 행진곡
- [대한민국 성장사 ⑱] 세파트(shepherd) 탈영사건
- [대한민국 성장사⑰] 전군(全軍) 각개점호(各個點呼) 실시!
- [대한민국 성장사⑯] 사라져간 구포(龜浦) 배(梨)
- [대한민국 성장사⑮] 교통경찰이 세우면 반드시 선다.
- [대한민국 성장사 ⑭] 마을 사람들 2편: ‘갑질’?, ‘짐승사 놈들’
- [대한민국 성장사⑬] 완사마을 사람들 1편 : 전역 후 공장생활
- [대한민국 성장사⑫] 탈영병을 찾아가다
- [대한민국 성장사⑪] 전장(戰場)에는 배고픔이
- [대한민국 성장사⑩]천국 같은 OP생활
- [대한민국 성장사⑨]참 어려운 살림살이
- [대한민국 성장사⑧]선비정신과 노블리스 오블리주
- [대한민국 성장사⑦] 각자도생(各自圖生)
- [대한민국 성장사⑥] 일계장 피복함
- [대한민국 성장사⑤] 나의 첫 부임지 ‘철원’
- [대한민국 성장사④] 아버지와의 마지막 여행
- [대한민국 성장사③] 탈주범의 꿈같은 하룻밤
- [대한민국 성장사②] 부엉이와 사돈
- [대한민국 성장사①] 어머니와 개다리소반(小盤)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