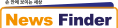살다보면 기분 나쁜 일들도 많기 마련인데 그중 하나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딱지를 떼이는 일일 것이다. 그것도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그냥 재수라고 인정하고 포기를 하지만, 단속 경찰관의 매복(함정단속)에 걸려 딱지를 떼거나 본인의 생각에 애매한 경우 단속되면 할 말이 많아지고 교통경찰과 시시비비를 다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이기는 경우는 없다. 다만 돌아서면 남자들은 치사한X들이라고 말하고, 여자들은 '비겁해요!'라고 말할 뿐이다. 지금은 폐지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의경(의무경찰)의 단속에 걸리면 정말 대책이 없다. 이들에게는 어떤 사정도 통하지 않을뿐더러 대화 자체가 되지를 않아 기분을 잡치고만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거다.
어릴 때 담력을 키우려고 공동묘지와 화장장에도 한밤중에 혼자서 다녀 보았고, 군에서는 죽음도 여럿 보았으며, 시신도 수습해 보았다. 아마도 보통사람보다는 담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도, 칼도, 귀신도, 귀신 잡는 해병도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딱하나 무서운 것은 의경이었다. 이들은 인정사정이 없다. 오로지 실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한다. 실적이 곧 자신의 최대 희망인 외출, 외박, 휴가와 직결 되었기에 경찰의 보조역을 충직하게 수행한다.
지금은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전국의 도로망에 속도위반단속을 알리는 표지판이 최소 수 키로미터 전부터 3~5백미터 전방까지 황색표지판으로 단속지점을 알려주고 있고, 패트롤카(순찰차량) 단속지점도 정해져있어 제한 속도를 잘 유지하고 가면 단속될 일이 없다. 또한 네비게이션의 아가씨가 단속지점을 미리 알려주기까지 하니 참 편리한 세상이다.
이런 세상이 오기 전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지금생각하면 참 우스웠다.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곡각 지점이나 도로의 구배가 심한지점 등 운전자의 전방 주시가 곤란한 지점에 경찰차량을 세워두고 경찰관 여러 명이 앞 뒤 이중으로 손을 흔들어 차량을 정지 시킨다. 너무 속도를 내거나 주의가 태만한 운전자는 이중으로 완수신호를 보내는 지점을 훌쩍 지나 차량을 세워 의도적으로 단속 경찰관이 쫓아오지 못하게 해 포기하게 하는 머리 좋은 사람? 도 있었지만 제지하는 경찰의 정지 신호에 그냥 달아날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갓길에 차량을 정지시키면 경찰이 다가와 경례를 부치고 “선생님(사모님)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달립니까?” 한다. “면허증 좀 보여 주세요”하면서 딱지를 떼려고 하면 알아서 배춧잎 한 장을 면허증과 함께 내밀거나 적발용지 철에 끼워주면 “조금 있다 출발 하세요”하면서 자리를 뜬다.
한번은 차체가 높은 SUV차량을 운전해 가는데 정지신호를 받고 갓길에 차를 세웠다. 다가온 경찰관이 경례를 부치며 “형님! 어디가십니까?” 하더니 차창 안으로 팔을 쑥 집어넣고서는 어깨를 주물러 된다. 얼굴을 보니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형님 같아 나도 모르게 웃고 말았고 옆에 동승해있던 사람이 “커피 값이라도 주세요”하여 배춧잎 한 장을 건네주니 “형님! 살펴가세요” 한다.
고속도로에서의 단속이유는 과속을 적발하는 것이었을 텐데 당시 스피드건(speed gun)은 차량번호까지 녹화기능은 없었던 것 같고 스피드건을 휴대한 경찰관도 보기 어려웠었다. 심지어 책 같은 것을 돌돌 말아 쥐고 겨냥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운전자들도 경찰관이 정지신호를 보내니 안 세울 수가 없었다. 속도위반이구나”하고 차량을 정지했고 당연히 통행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었다.
다시 말해 경찰관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를 향해 무조건 손을 흔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고 운전자는 자기 속도도 모른 채 차량을 세웠다. 경찰관은 속도위반 근거를 댈 수가 없으니 속도위반이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알아서 통행세를 납부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세금은 승용차는 무조건 만원인데 가끔 오천원만 주고 말았다는 경제적인 사람도 더러 있었다. 시내에서 1톤 봉고트럭으로 계란장사하는 사람이 단속에 적발되어 오천원에 흥정하였는데 경찰관이 잔돈이 없어 그냥 자리를 뜨자 마이크로 잔돈 내놓고 가라고하며 경찰차량을 따라 다녔다는 이야기가 한때 화재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교통경찰에는 오토바이 단속반도 있었다. 오토바이는 소리 없이 강한 놈이다. 한번 액셀을 슬쩍 당겼다 놓으면 수백 미터는 소리 없이 달린다. 운전자는 뒤에서 누가 오는지 전혀 알 수 가없다. 1980년대 TV이서 매주 일요일 방영된 “기동순찰대(機動巡察隊)”라는 드라마에서 미국 켈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경찰관 “펀치(Erik Estrada)”와 “존(Larry Wilcox)”의 활약상과 그들이 타고 다니는 멋진 오토바이는 당시 아이들과 어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이드라마는 “CHIPS 99”라는 제목의 영화로 리메이크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교통경찰의 오토바이도 드라마의 오토바이처럼 멋있었고 라이방(RayBan-썬글래스)을 끼고 말 장화를 신은 교통경찰은 펀치보다 더 멋있었다.
회사에서 일하던 어느 날 급하게 물건을 납품해 주어야 할 일이 생겼는데, 마침 그날이 토요일 오후라 기사들도 없고 사무실 직원들도 모두외근을 나가 운행을 할 사람이 없었다. 하는 수없이 내가 차량을 운행하여 그 회사에 운송 해주어야 할 상황이다. 운송 트럭은 5톤 트럭인데 호로(포장천막)가 높게 쳐져있다. 지금은 컨테이너 트럭이나 윙 컨테이너 트럭으로 발전 되었지만 시커먼 호로를 친 차량은 굉장히 커 보인다. 하는 수없이 물건을 싣고 산업도로를 급하게 달려가는데 왱~왱~하는 소리가 뒤에서 나 길래 백밀러를 보니 경찰 오토바이가 쫓아오면서 정지신호를 보낸다. “이크! 급했더니 딱 걸렸네!” 싶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지갑을 꺼내 5천원을 줄까? 1만원을 줘야하나? 생각하다 만원짜리를 뽑아 들었다.
그런데 경찰관이 운전석 쪽으로 오지를 않는다. 이상타 하면서 백밀러로 이쪽저쪽을 살펴보다 조수석 쪽 백밀러를 유심히 관찰하니 이양반 뒷바퀴 축에 몸을 바짝 붙여 볼일을 시원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가 막혀 끝날 때 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한참 후 운전석 쪽으로 돌아 나와 손을 흔들고는 오토바이를 타고는 여유 있게 앞으로 달려 나간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던지 나도 돈 생기면 마누라 승인을 받고 저놈의 오토바이 꼭 타고말리라 생각했지만 그 꿈을 죽을 때 까지 이루긴 어려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때는 그래도 인정이 많았던 시절인 것 같다.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이 되어도 흥정이 가능하고 웃을 일도 많았으며, 지금과 같이 세상사가 각박(刻薄)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런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하여 지금과 같이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깊어가는 겨울밤 그분들도 이제는 모두 퇴직하여 주점에서, 고향의 사랑방에서 로변정담(盧邊情談)을 나누며 모두가 아둔했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고 부끄러운 웃음을 짓고 있을 것이다.
배종진 | 향토사학자·문화재청 방문교사·예비역 포병장교
관련기사
- [대한민국 성장사 ⑭] 마을 사람들 2편: ‘갑질’?, ‘짐승사 놈들’
- [대한민국 성장사⑬] 완사마을 사람들 1편 : 전역 후 공장생활
- [대한민국 성장사⑫] 탈영병을 찾아가다
- [대한민국 성장사⑪] 전장(戰場)에는 배고픔이
- [대한민국 성장사⑩]천국 같은 OP생활
- [대한민국 성장사⑨]참 어려운 살림살이
- [대한민국 성장사⑧]선비정신과 노블리스 오블리주
- [대한민국 성장사⑦] 각자도생(各自圖生)
- [대한민국 성장사⑥] 일계장 피복함
- [대한민국 성장사⑤] 나의 첫 부임지 ‘철원’
- [대한민국 성장사④] 아버지와의 마지막 여행
- [대한민국 성장사③] 탈주범의 꿈같은 하룻밤
- [대한민국 성장사②] 부엉이와 사돈
- [대한민국 성장사①] 어머니와 개다리소반(小盤)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