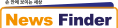최근 들어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탄핵 사태로 정치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가 없는 대신 그 자리를 관료 출신들이 치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5일 시민단체인 사회공공연구원이 공공기관장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관료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으로 가는 사례가 많아졌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청와대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면서 '정피아'(정치권 인사+마피아)가 움직일 수 없는 공백을 틈타 관피아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관피아 문제가 더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피아라고서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수십 년간 관련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쌓아온 전문성이 있고 공공기관과 주무 부처 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도 할 수 있다.
또 현재와 같은 정권의 임기 말에는 상대적으로 잡음의 소지가 적고 능력이 검증된 관료 출신이 선임되는 경향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이 기관장으로 가는 게 문제가 되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관장으로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보기에 따라서 능력 있는 모피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피아 개개인을 두고 봤을 때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관피아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좋은 자리를 독차지하는 것이 관피아의 폐해라는 것이다. 또 관료 출신이다 보니 '친정'인 주무부처와 결탁 가능성도 있다.
윤석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외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하니 관료 출신이 아니면 사장으로 못 가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매번 낙하산이 내려오면 '줄서기 문화'가 생길 수 있고 새로 온 사장이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며 조직을 바꾸려 들다 보면 효율성이 무너지고 사기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교수는 관피아를 예방할 수단으로 공공기관 내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사회가 현 CEO의 연임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내외부에서 발굴·육성된 CEO 풀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 CEO 임기가 끝나고서 부랴부랴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임자를 선임하다 보니 당국의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대안이다.
김상조 교수는 "관피아 경향이 최근 나타나는 것은 한편으로 정치권력의 공백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 CEO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관피아를 근절하려면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이사회가 평상시 CEO 프로그램을 구축해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전에 관피아가 오는 것을 막기 힘들다면 사후적으로라도 관피아를 평가해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철 연구실장은 "관피아들이 기관장으로 재임 시 일으킬 문제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외에 별다른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관피아가 민간기업으로, 특히 금융 분야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 금융기관종사이력제, 감독기구 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려면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기관종사이력제의 골자다.
전 교수는 감독기구 정년제에 대해서는 "행정고시 후배가 금융감독원장이 되면 그 위 기수는 모두 퇴직해야 한다"며 "그러나 기수 문화와 관계없이 정년이 보장된다면 관피아가 민간기업에 가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