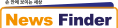말은 아름답다. 백성이,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미다. 딱 거기까지다. 취지를 빼고 나면 세상에서 더 이상 한심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다. 특히 1인 1표 대의 민주주의가 그렇다.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라고 들어보셨을 것이다. 수학 천재 가우스가 측정오차의 분포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해서 '가우스 곡선’이라고도 부르는 말이다. 신장, 지능, 지성의 분포 등을 설명할 때 흔히 활용되는데 이 곡선을 투표라고 하는 정치 형식에 넣어보자. 지능이 매우 뛰어난 상위 0.5%의 목소리는 같은 비율인 하위 0.5% 백치들의 목소리에 의해 사라진다. 평균보다 20% 이상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의 분포는 25% 정도다. 이들의 의견 역시 같은 비율인 25%를 차지하는, 평균보다 20% 낮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상쇄된다. 그 결과로 남은 평균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승리하게 된다. 어쨌거나 그들은 45% 이상이니까. 이게 1인 1표 대의 민주주의의 참상이다. 아인슈타인도, 미제스도, 스티븐 호킹도 다 한 표다. 백치 아다다, 벙어리 삼룡이, 아큐정전도 다 한 표다. 이게 정상이냐.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평균 정치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눈앞에 있는데 태연하게 후진 것을 골라놓고, 좋은 것을 애써 외면하며 참 잘 골랐네요 서로 위안하는 멍청한 짓이 민주주의다. 처칠이 민주주의를 최악의 정부 형태라고 말한 것은 아마 이런 맥락이었을 것이다.
말만 아름답다. 인민이,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니 얼마나 고맙고 갸륵하며 기특하냐. 딱 그 대목까지다. 백성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주인 노릇을 하는, 주인 자격이 있는 백성이다. 이 백성은 생각할 줄 알며(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다) 비판 할 줄 알며 양보할 줄 알며 관용할 줄 안다. 다른 하나의 백성은 투표를 위해 존재하는 백성이다. 이기적인 엘리트 집단에게는 이런 백성이 꼭 필요하다. 이 백성은 하나하나는 시시하지만 모여서 표가 되면 권력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선물한다. 기요틴이 그랬던 것처럼 그 권력의 희생물이 되는 것 역시 이 백성들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우리를 생각하는 백성으로 여길까 아니면 투표하는 백성으로 여길까.
2009년 2월 재외국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다. 영주권 상태로 있는 재외국민들도 해당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내국인 신분이니까 선거권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법이 이해가 되는가.
국민은 네 가지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다. 그들은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가? 국방의 의무를 지는가? 보수주의 철학의 지존인 에드먼드 버크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 자치권을 주어야 한다고, 즉 독립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메리카에서 세금을 걷으면 당연히 아메리카 주민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을 뽑아 런던으로 보내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메리카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 국회의원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결국엔 영국 정치가 아메리카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아메리카에 대해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획기적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어느 논리가 올바른가. 노동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있는 곳에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 법을 통과시켰다. 여ㆍ야 모두 득실을 따졌을 것이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면 결코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다. 조지아 주 아틀란타 한인회 회장인 은종국씨는 재외국민 투표권이 미주 한인들의 미국 사회 정착에 방해가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 배려가 없어야 교민들의 미국 현지화에 힘을 모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주류사회, 특히 정치 분야에의 진출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떠나온 나라에 눈길을 주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했다. 재외국민투표법은 상식과 현실을 짓뭉갠 정치의 논리다. 백성을 졸로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다.
민주주의, 말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라는 단어에는 여러 차원의 민주주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어느 가난한 나라에서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다고 그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난하니까 교육수준도 낮을 것이고 가우스 곡선의 원리에 따라 어이없는 정책과 선전에 표를 던졌을 것이다. 가령 학교 급식을 공짜로 하겠다거나 교통비를 면제해주겠다는 식의. 가우스 곡선의 원리에 따라 평균보다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나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가우스 곡선의 원리에 따라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당연히 평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뭘 그런 걸 신경 써 하며 코앞의 이익에 매진했을 것이고. 나중에 급식비와 교통비가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다음이다. 그래서 대처는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한 것이다. 여러분, 사회 같은 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느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날 하루만 주인 노릇을 한 것이다. 그것도 자신들을 더 노예상태로 옭아매는 장치에 신나서 서명하는.
민주주의, 대체로 멍청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에 죄가 있는 건 아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 일정하게 유용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서 민주주의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민주주의를 어떤 사람들이 운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한 사회의 질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의해 민주주의의 수준이 결정된다. 평균의 눈높이가 성숙한 시민 의식에 도달해야 그때부터 우리는 그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모든 국민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민주주의를 갖는다. 멍청한 국민들에게는 싸구려, 일회용, 투표함 민주주의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가리켜 천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collecter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