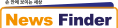1974년 7월 어느 날. 서울 용산의 육군본부 건너 편 병영의 흉가 집 같은 막사를 개조한 ‘비상군법회의’ 재판정은 서릿발 같은 살기와 뜨거운 열기가 뒤섞인 채 숨 막힐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국민시선도 언론취재도 미치지 못하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민청학련 피고인 25명의 긴급조치 1, 4호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법대(法臺)에는 재판장 이하 여러 명의 군 장성, 영관급 심판관들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김지하 이철 류인태 등 피고인들이 앉아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가족들이 초죽음이 된 채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중앙정보부에서 있었던 2개월여의 모진 강압수사 끝이라 모두 초췌할 대로 초췌해 있었다. 말이 재판이지 그건 재판이 아니었다. 군법회의라는 형식을 빌린 ‘토벌’이었다.
재판은 “저 대역 죄인들이 폭력혁명에 의해 국가를 전복하고 노농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 하겠다“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유신반대 시위였을 뿐, 반국가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려 했다.
김지하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앉을 때 교도관이 눈치 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필자 곁에 다가와 앉았다. 그리고선 묻는 것이었다.
“형,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를 위해 떠든다고 합니다.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 이 재판정에서 아예 유신체제 타도를 선언해버리면 어떻겠소?”
그래서 필자는 대답했다.
“그건 그간의 사실과도 다르지 않소?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당한 희생양이자 순교자적인 본연의 위치 그대로 나가야 할 것 같소.”
그래서였을까?
김지하는 검찰관과 재판장의 집요한 강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진술에서 섣부른 ‘과대포장’을 하려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시위를 하려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엔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는가?”
그러자 김지하는 수갑을 늘어뜨린 두 팔을 번쩍 들어 보이며 벽력같은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엔 이 모양으로 오라 줄에 꽁꽁 묶이고 수갑 찬 신세밖에 더 됐느냐는 소리였다. 그 순간 필자는 “김지하 잘 했다”고 쾌재를 불렀다.
그런 김지하 시인이 어제 JTBC TV에 나와 ‘여성대통령 대망론‘을 비쳤다.
모든 걸 마음의 품 안에서 녹여버리고 달관한 자세로 자신을 초극(超克, 초월하고 극복함)한 것일까? 그런 것일 것 같다.
미움은 자신의 감옥이다. 이 감옥을 벗어나 그는 자유인으로 날고 있었다. 자유인 김지하 시인의 그런 선택은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과는 격단(格段)의 차이가 있다.
그의 선택은 “지난날 박정희 시대와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아주 특별한 사유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근일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