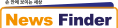참으로 답답하다. 탈북자 31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언제 북송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는 데도 속수무책이다. 이들이 북한으로 끌려가면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에 갇히거나 총살될 지도 모르는 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심지어 이들이 북한으로 이송되면 ‘3대 멸족’에 처해진다는 말까지 있다. 사정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이 문제를 중국과 적극적 외교로 풀어야 할 외교부의 대응은 너무 형식적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대사나 참사관을 불러 선처를 부탁하고 중국 현지의 우리 공관을 통해 중국 외교부에 인도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번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체포된 탈북자의 한국 내 가족을 불러 위로한 것이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상당수가 먼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의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감시가 심한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땅 에서 유랑하다 체포된 것이다.
조용한 외교로 풀린 문제는 거의 없어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바빠진 것은 시민단체들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10개 북한인권단체 회원들은 지난 14일 추위 속에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반대 시위를 벌이며 “탈북자 강제송환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조약과 유엔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 상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라며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의 난민여부를 심사하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출국하도록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에 있는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잔 솔티)도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 “방미 중인 시진핑 중국국가부주석에게 인도주의적 탈북자처리를 촉구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탈북자문제가 본격화된 지난 90년대 초부터 20여 년 간 우리의 선처 요구와 중국의 거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시위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탈북자 문제로 국내외 여론이 들끓으면 외교부는 큰소리를 내기보다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면서 ‘조용한 외교’를 강조했다. 그러나 조용한 외교로 풀린 문제는 거의 없다. 탈북자 강제북송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외교부가 한 일이라곤 중국 내에서 떠돌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들의 눈을 피해 일본 등 서방국가의 외교공관 담을 넘어 피신하면 중국과 협상을 벌여 이들을 데려오는 것이었다. 중국이 국제여론을 의식해 물러섰기 때문이다.
탈북자문제는 본질적으로 유엔이 정한 난민문제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해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극도의 빈곤이나 기근을 피해 도망 온 사람도 포함된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박해나 극도의 빈곤을 피해 나온 사람들로 유엔이 정한 명백한 난민이다. 난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강제송환은 금지돼 있다. 우리는 물론 중국도 난민협약에 가입돼 있다.
아직도 진영외교 습관에서 탈피 못해
그런데도 중국이 북-중간에 맺은 월경(越境)조약에 따라 탈북자를 단순 월경인으로 간주해 북송시키고 있으나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외교의 고질적인 병폐인 ‘눈치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록 소국이었지만 중소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체외교를 확립했는데도 우리는 세계 무역 10대국이라면서도 아직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 동서냉전시대에 미국의 주장만 따라가던 진영외교습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독자적인 외교를,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자세를 확립해 중국과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의 부당한 탈북자 강제송환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권국인한 중국이 대국이라고 중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자세를 벗어나야 한다. 우리 동포는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언제까지 ‘조용한 외교’라는 명분으로 당면현안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 뒤로 숨는 행태를 반복할 것인가.
도준호 본사대표(전 조선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