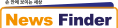불황으로 실질임금이 줄고 물가가 오르자 생활비를 제외한 분야의 소비를 대폭 축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29일 통계청 등의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가구 기준)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가계의 ‘소비지출’ 중 생활비 비율이 24.3%였다. 가구당 소비지출은 239만 5,583원 , 생활비는 58만 2,890원이었다.
생활비란 식료품비(식료품+비주류음료)와 주거비(주거+수도+광열)를 합한 것이다. 생활비에 교육비·교통비·오락문화비를 더하면 소비지출이 된다. 여기에 저축과 비소비지출(세금·이자 등)을 합하면 가계소득이다.
올해 생활비 비중 24.3%는 통계청이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집계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산출한 200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다.
최고치는 통계 작성 첫해인 2003년, 2004년 모두 24.7%였다.
국민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생활비 비중이 떨어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생활비 비중 급등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주범은 고물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해는 예외 없이 생활비 비중이 높았다.
2003년 물가상승률은 3.5%, 2004년은 3.6%였다. 올해의 물가상승률(잠정치)은 4.0%다. 생활비 비중이 가장 낮았던 2007년(23.2%) 물가상승률은 2.2%에 그쳤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높은 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자 교육비·교통비·오락문화비 등을 축소한 탓에 생활비 비중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 입장에서는 불황에 대비해 소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가계 소비가 줄면 내수 부진으로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악화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큰 향후 1∼2년 내에 고용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임 위원은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