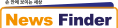[박남오 기자]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호흡기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관여하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자율신경계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온도와 습도 변화가 급격하면 자율신경계에도 무리가 오게 되고 여러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하루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환절기에는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호흡기질환이 자주 발생해 건강을 해치기 쉽다고 조언한다.
정태하 세브란스병원 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이 외부 자극을 잘 견디게 해주는 것"이라며 "불균형이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져 평상시보다 외부 바이러스의 침입이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에는 날씨 자체가 춥다 보니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지만, 봄철에는 얇은 옷을 입고 나갔다가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옷은 얇은 옷을 여러 벌 준비해 기온이 낮은 아침에 보온을 위해 겹쳐 입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목을 따뜻하게 하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카프 등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린이나 노인 등은 온도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체온 유지에 보다 더 신경 써야 한다. 평소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찬 공기에 기관지가 수축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도 건강엔 적신호다.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주는 코점막이나 인후두부의 점막이 건조해지면 물리적인 방어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습도가 낮으면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며 "남극처럼 기온이 완전히 낮은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없지만, 요즘처럼 애매한 추위는 건조함도 심해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다"고 설명했다.
몸속 바이러스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이용해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야외활동 후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이진국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건조한 공기에 기관지 점막이 마르게 되면 세균과 바이러스 전파가 쉬워진다"며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통해 습도를 유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기온이 낮은 아침과 저녁은 피해야 한다"며 "집에 돌아온 뒤에는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코나 입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손을 꼼꼼히 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콧속 점막 등 몸속 수분을 충전시키기 위해 하루 1.5∼2ℓ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흡연이나 커피는 탈수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