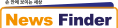5월 초, 장마처럼 주룩주룩 비가 내린다.
비 내리는 날이 참 좋다. 모든 게 씻기어 내리고 조용해진다. 마음이 가라앉는다. 밑으로 밑으로...
이런 날 작은 의자를 베란다 끝에 옮겨 비 구경을 한다.
창밖의 줄지어 서 있는 나무들. 빗소리 외에는 들리는 게 없다. 참기름을 칠한 듯 반짝거리는 연초록색 감잎에 빗방울이 미끄러지듯 떨어진다. 낙화 때 정신 나간 여인의 속치마 같다고 친구가 싫어했던 목련나무에도 잎이 무성해져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제법 크게 들린다. 밥 한 사발을 너끈히 쌈을 싸도 될 것 같은 잎이 큰 후박나무에 후드득 소리까지 내면서 떨어진다. 넝쿨나무에도, 은행나무에도, 모든 나무에 합창곡을 만든다. 빗줄기가 세어졌다. 약해졌다. 바람까지 곁들인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합창곡. 편하다. 이보다 더 좋은 음악이 무엇이 있을까? 처마 끝 줄줄이 내리는 낙수를 쳐다보고 있노라니 옛 생각이 난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잘 쓸어 놓은 흙마당에 밤새 비가 내려 비 자국이 생겨 있고. 처마 끝 방울방울 떨어지는 낙수에 접시모양의 작은 웅덩이가 처마 따라 길게 생겨나있고 그 작은 웅덩이 속에는 아주 작은 조약돌이 드러나 재미있는 풍경을 만들어 놓는다. 접시 속에 작은 파문이 생기면서 조약돌은 춤을 춘다. 축담에 쭈그리고 앉아 모양과 색깔이 다른 예쁜 조약돌을 자세히 보려고 머리를 내밀면 머리 뒤 꼭지에 물방울이 떨어져 간지럽게 목덜미로 내려온다.
재미있어 계속하다 보면 머리는 다 젖게 마련이다. “야이야 니는 와 밥 먹고 학교 갈 준비는 안 하고 비 오는 날 온 동네 쏘다니는 강아지 매로 머리는 다 적셔가지고 그게 뭐꼬?” 하고 야단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조약돌 몇 개를 주워 벌떡 일어난다. 옛 생각에 젖어 줄줄이 내리는 처마 쪽 빗물을 쳐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갑자기 그 아저씨가 떠올랐다. 급하게 나갈 채비를 하고 우산을 들고 지하철을 탔다. 그 아저씨가 그 자리에 계실까? 오랜 세월이 지나 계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불현듯 그 자리에 가보고 싶어졌다.
아이들 어릴 적엔 둘째가 사내아이라 한 달에 신발 한 켤레씩을 사 줘야하고 키도 잘 자라 옷 사기도 힘겨웠다. 동네 형들에게 얻어 입히지만 늘 부족했다. 박봉을 이리저리 쪼개서 살림을 해야 하는 주부로써 늘 남대문 시장을 불난 집 새양쥐처럼 들락거렸다.
그 날도 비 오는 날이었다. 시경 앞 남대문 시장에 도착해서 중국산 자동 우산을 폼 나게 쫙 펴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내 얼굴에 비가 후드득 떨어졌다. 내가 우산을 잘못 폈나 하고 쳐다보는 동시에 버스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들이 “저 아줌마 우산 좀 봐” 하고 까르르 웃었다. 내 우산 지붕은 접시비행기 마냥 날아서 4 ~ 5m 전방에 떨어졌다. 나도 어리둥절해서 우산대만 쥐고 비를 쪼르르 맞았다. 우산지붕을 주워 들고 가게 처마 밑으로 들어갔다. 비는 내리고, 갈 수도 없고, 비 그치기를 기다리며 쭈그리고 서 있는데 신문 가판대 아주머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시경 앞은 차 소음과 빗소리 때문에 옆에서 이야기해도 잘 들을 수 없었다. 손짓 발짓 목청에 핏대올려 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시경 앞 지하보도에 내려가면 우산을 무료로 수선해 주는 아저씨가 비 오는 날만 12시까지 계시니 빨리 가보라고 재촉하기에 한 달음에 뛰어갔다. 아저씨가 우산을 고치고 계셨고 그 주위에 너댓명이 아저씨를 중심으로 모두 쪼그리고 둘러 앉아있었다. 나도 슬그머니 그 옆으로 가서 그 모양새로 앉았다.
어두침침한 시경지하보도.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이었다. 차례로 우산을 고쳐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어떤 분은 매화 그림이 있는 지폐 한 두장을 내밀었으나 그 아저씨는 손사래를 치면서 보일락말락 한 미소로 답했다. “그 아저씨 수선비 안 받으세요.” 옆에 있던 아저씨가 거들었다. 허름한 바지와 잠바차림새가 옹색해 보였다. 나 역시 90도 절을 하면서 “그냥 갈려니 염치 없네요.” 하면서 머뭇거리니 “괜찮아요.” 하시면서 12시가 되니 벤치와 철사 몇 줄을 들고 일어나 가셨다. 그 후 몇 번이나 고장 난 우산 꾸러미를 들고 그 지하보도를 찾았고 그 아저씨는 아무 말씀 없이 우산을 고쳐 주셨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커 갔고 일상이 바쁘고 중국산 수입으로 양산 값이 싸지니 그 아저씨를 새까맣게 잊어 버렸다.
지하철 앞쪽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그 지하보도를 내려갔다. 옛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말끔히 단장됐고 불빛도 환했다. 좋은 물건들이 잘 진열되어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이리저리 한참 서성이다가 커피를 팔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물어 보았다. “이런 이런 아저씨가 오래전에 계셨는데...” 어떤 답이 나올지 예상했지만 “모른다.”라는 대답이 나왔을 때 왜 그리 서운했을까?
30여 년 전 일이다. 지금은 살림살이들이 풍족해 쓸 만한 물건들도, 먹을거리도 젊은이들은 잘도 내다 버리지만 그 땐 살기 어려운 시절이라 우산하나도 고쳐쓰고, 고쳐쓰고, 녹이 슬어 살이 부러져 재생 불가능할 때까지 수선해 썼고 찌그러진 우산도 잘도 쓰고 다녔다.
‘재능기부’는 요즘 생겨난 신조어이다. 지하보도를 터덜터덜 올라오면서 그 시절을 생각해봤다. 자기 삶도 지탱하기 어려웠던 때에 남을 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그 아저씨는 봉사라는 것은 정신적인 ‘풍요’ 라는 것을 그 때 벌써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아저씨가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계셨으면 하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돌아오는 길 맞은편 보도 위를 주룩주룩 내리는 비에 우산을 받쳐 든 그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걸어올 것 같다. 내 우산 위로 달콤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 류송자 (1944~)
1944년 경상북도에서 태어나,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하였다. 이후 2011년, 문학미디어 봄호를 통해 수필로 등단한 이후 꾸준한 활동을 계속 해 오고 있다. 글 <그 아저씨>는 2015년 공저한 책 <길을 묻다>에 실린 글이다. 배우, 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재훈’의 외할머니로도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