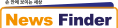3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막한다. 전세계 196개국 협약당사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1일까지 회의가 진행된다. 공식 개막에 앞서 29일부터 회의는 이미 시작됐다.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뒤를 이을 '파리 의정서'가 채택될 것인지 여부다. 당사국들은 이미 올해만 10여 차례 공식·비공식 협상을 통해 26개 조항으로 짜인 30쪽 분량의 신기후체제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번 총회에서 '파리 의정서'가 채택된다면 이는 역사적 합의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명기하기는 했으나 지구촌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부담은 제외했었다. 이번에 논의되는 파리 의정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쪽짜리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지향점이 있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장치는 국가별 자체기여방안(INDC)으로, 지금까지 178개 당사국이 이를 제출한 상태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26~28%,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35%, 일본은 2030년까지 26%를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에 예상되는 배출전망치에 비해 37%를 감축한다고 제안한 상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줄이겠다고 했다.
협상 당사국들은 전 지구적으로 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치를 두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합의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 파리 총회의 쟁점은 이 같은 법적 구속력에 어느 정도의 강도를 부여할지, 그에 따른 이행절차는 어떻게 마련할지에 모아진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협상 당사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실이다. 교토 의정서에서 빠졌던 미국이 그렇고, 중국도 긍정적인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다만, 서로 다른 경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이 이에 따른 '차별화된 책임'을 어느 선에서 인정하고 합의안을 만들 것이냐 하는 점은 난제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출국해 당사국 총회와 병행에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의 내용은 신 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리 기후변화 회의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합의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의정서 채택이 지연되더라도,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기후체제 발효를 상정해 놓고,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기왕에 마련된 대응책은 다듬고 실현 가능성을 재차, 삼차 점검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이상론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니라며 느슨하게 대응해서는 더욱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