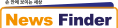2월 20일, 故황장엽 선생의 생신기념예배가 있단다. 자신의 죽음으로 “북한민주화위원회”와 탈북자들의 존재를 알리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총총히 떠난 고인... 10여년을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지만 언제한번 제대로 된 생일을 맞은 적 없었다.
내가 뭘 한 것이 있어 생일을 쇠는 가 하지만, 가족사진을 늘 품고 다니던 고인은 생일소리에 유난히 격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생일은 무슨 놈의 생일, 나 그깠거 몰라!”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물론 곁에서 보는 사람도 민망하기 그지없었던 그 순간들은 오로지 고인의 생일과만 연계되곤 했다.
어느 해인가는 “탈북자동지회”임원들이 생일상이랍시고 차려놓고 세 시간을 꼬박 기다렸지만 고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은 적도 있었다. 전화로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여쭈었던 어느 여성탈북자는 엄청난 욕을 혼자서 얻어먹고 눌물까지 흘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정 떨어질 만큼, 그리고 노망이라 할 만큼 생일소리만 하면 펄펄 뛰던 고인을 그래도 생일상 앞에 앉혀놓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평생친구라던 신학대학의 여 교수님과 여전도회의 권사님들, 김동길, 조갑제, 이동복 선생과 서정갑 회장을 위시한 대령출신의 재향군인들...그리고 이제는 저세상 분들인 민관식, 황인성 선생님...
그렇더라도, 설사 지인들의 성의를 뿌리치지 못해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 생일상이 조금이라도 요란스럽다 싶으면, 아니, 기념품이나 케익 같은 것이 놓여있으면 심부름꾼에 불과한 주변 탈북자들이 겪는 “수모”또한 상상을 초월했다. “이딴거 누가 준비하래?!” 그럴 때 고인은 학자이거나 노동당 비서가 아니었다. 주변관리가 도저히 안되는 철부지 어린이 같았다!
보다 못해 고개를 돌려버리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다 늙은 사람이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해 줘야지”하고 되받던 여섯 살 터울의 전 국회의원이 있었다.
이곳 남한 땅에서 유일하게 “장엽이, 장엽이”하던 그 민관식 선생이 돌아가신 후로는 누구도 선물 같은 것을 생각해 본적 없고, 자그마한 케익 하나에도 거의 "목숨을 걸곤 했음"을 확언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아는 생일케익 한 개도 그렇게 마음 쓰시던 고인의 생신을 기려 기념예배가 열린다니 이제, 케익 한 개 거뿐히 들고 찾아갈 생각이다.
탈북자 김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