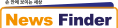마이어(B. R. MYERS)씨는 대한민국 해군 천안함 수병으로 복무하다 2010년 북한의 폭침으로 전사한 문영욱씨가 재학했던 부산 동서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이자 교수다. 마이어 교수는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통’이다. 그런 마이어 교수가 분노의 글을 미 뉴욕 타임즈에 기고했다. 내용은 “미국은 왜곡된 민족주의에 휩싸인 한국을 돕기 위해 북한 응징에 앞장서지 말라”는 것이다. 2010년 5월 17일자 뉴욕타임즈다. 그 배경이 충격적이다.
마이어 교수는 동서대 학생 문영욱 군이 북한 폭침으로 전사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글을 써내려갔다. 그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 김정일 정권에 분노하는 동서대학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수의 학생들이 이명박정부의 `천안함 음모설’을 믿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마이어 교수는 동서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 거의 대부분이 가능한 한 빨리 천안함 사건을 잊기를 원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평양 김정일 정권에 대한 동조는 한반도 남서지역,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만연한 호남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Sympathy for Pyongyang is especially widespread in the peninsula’s chronically disgruntled southwest, Gwangju)
한국인들의 삐뚤어진 민족주의
마이어 교수는 2002년 의정부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사고를 상기시켰다. 당시 온 나라가 두 여중생을 추모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촛불로 뒤덮였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처럼 흥분하던 한국민이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용사들이 전사했는데 전혀 분노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 했다. 그는 그것을 “삐뚤어진 민족주의”라고 정의했다. 마이어 교수의 결론은 “한국인의 애국심과 미국인의 애국심이 많이 다르니 미국이 북한 응징에 한국보다 앞장서면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응징에 적극적인 미국에게 “한국을 돕지 말라”는 메시지다.
무엇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이어 교수를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2002년 숨진 의정부 여중생은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인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교통사고’ 사망자다. 여중생 2명이 귀가 도중 미군 장갑차를 채 피하지 못했고, 미군 장갑차 운전병은 키 작은 여중생들을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단순 사고다. 이런 종류의 교통사고는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교통사고는 `고의’가 없다.
사람을 치어 죽이려고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미군 장갑차 운전병이 한국 여학생 2명을 `살해’하려고 장갑차를 몰았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천안함 폭침은 살인행위, 전쟁행위다. 한반도가 정전상태라지만 `휴전’에 합의한 상태다. 휴전은 선전포고 없이 어떠한 군사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다. 따라서 잠수함 어뢰 공격은 전쟁행위에 해당된다. 의정부 여중생 2명의 교통사고와는 본질이 다르다. 그런데 2002년 이 땅의 좌파들은 촛불을 들고 나와 미국을 규탄했다. 반면 천안함 46용사가 전사했는데도 단 하나의 촛불도 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은 지방선거 막판 “전쟁이냐 평화냐”를 외치며 촛불을 선동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마이어 교수는 2002년과 2010년에 벌어진 기막힌 이 땅의 민족주의에 기가 질린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응징하면 할수록 한국민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같은 동포인 북한을 벌주는 미국을 미워할 테니 “제발 미국은 북한 응징에 나서지 말라”는 요지다. 마이어 교수의 글은 2010년 5월 27일 뉴욕타임즈에 실렸다. (마이어 교수 기고문 영어 원문 첨부)
마이어 교수의 기고를 새삼 소개하는 이유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이 땅의 철딱서니 없는 젊은이들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천안함 폭침 2주기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란 정부 발표를 믿는다'는 응답이 20~30대에서 5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믿지 않고 온갖 괴담과 유언비어에 빠져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 비율은 20대 여성(45.6%)과 30대 남성(43.1%)에서 가장 높았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 전체적으로도 ‘정부 발표를 믿는다’는 대답이 71.3%로, 1년 전 천안함 폭침 1주기에 실시한 문화부·조사에서 응답한 80.0%에 비해 8.7%포인트나 낮아 졌다. 얼빠진 20대 여성의 45.6%와 30대 남성의 43.1% 때문이다.
“마이어 교수님께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 윤청자 씨와 참여연대, 천안함 망언 34인
천안함 전사자인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68)는 아들 전사보상금 등을 합해 1억여 원을 방위성금으로 내놨다. 윤씨는 “작지만 무기 구입에 사용하여 우리 영해·영토 한 발짝이라도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하는데 사용해달라”고 했다. 윤여사가 기탁한 방위성금은 K-6 ‘3.26 중기관총’으로 거듭나 해군 함정에 배치됐다. 윤 여사는 경기도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1000만원의 성금을 받자 “이 귀한 돈을 하루도 집에 놔둘 수 없다”며 그 다음날 평택 2함대사령부에 전달했다.
윤 여사에게 성금을 전달한 이 기업 직원들은 "천인공노할 북한의 만행에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앞장서 규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반쪽짜리 결의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키는 것을 보고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TV를 통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기탁하며 우리 영토를 침범한 이들을 응징하는데 써달라는 여사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윤 여사는 천안함 46용사 영결식에서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게 “북한에 왜 퍼주십니까. 쟤들이 왜 죽었습니까”라며 통곡했던 분이다.
친북-반국가 언동자 34명 기억해야
민평기 상사 모친이 1억원을 기탁한 그날 참여연대는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으로 규명한 국제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서한을 유엔안보리에 보냈다. 참여연대 주장을 따르면 민평기 상사 등 46 용사가 `의문사’했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를 만들어 인간광우병을 날조하고 “청와대로 가자”고 선동해 서울을 100일 동안 무법천지로 만든 단체다. 2006년 서울 종로에 5층짜리 빌딩을 지으면서 850개 기업에 `계좌당 500만원 이상씩 후원금을 달라’고 요구한 단체다. `1억원’ 안보기금을 기탁한 민 상사 모친과 참여연대의 국가관과 애국심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독이다.
참여연대 같은 존재는 널려 있다. 국가정상화추진위는 천안함 피폭과 관련한 `친북-반국가 언동’ 인사들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들을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에 우선 포함시켜 두고두고 후손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도록 했다. `친북·반국가 언동자’는 모두 34명이다.
정계에서는 김효석, 박영선, 박지원, 송영길, 유원일, 이강래,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최문순, 한명숙(민주당), 강기갑(민노당), 유시민(국참당), 노회찬(진보당)이 선정됐다. 학계는 강정구(동국대), 고유환(동국대), 김근식(경남대), 김용옥(원광대), 김용현(동국대), 백학순(세종연구소), 양무진(경남대), 정성장(세종연구소), 홍현익(세종연구소) 9명. 또 김성전(국방정책연구소), 김종대(D&D 포커스), 박선원(전 청와대 비서관), 백낙청(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 송영무(전 해군참모총장), 신상철(서프라이즈 대표), 이종인(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최강욱(변호사),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등 11명이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천안함 46 용사를 모욕한 이들을 응징하는 그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오윤환 뉴스파인더 논설위원
South Korea’s Collective Shrug
By B. R. MYERS
NEWYORK TIMES Published: May 27, 2010
ONE of the students at my university was killed in the attack that sank a South Korean naval vessel on March 26. A visual communications major, Mun Yeong-uk was only a few months from concluding his military service when a North Korean torpedo split the warship, the Cheonan, in half. His classmates loyally collected money for his family’s funeral expenses, but I was struck by how few people on our campus evinced any real anger toward the regime of Kim Jong-il.
This lack of indignation is mainstream here. Most people now accept North Korea’s responsibility for the sinking that killed Mr. Mun and 45 other sailors. A small but sizable minority suspect an elaborate government conspiracy of some sort. What almost all seem to share is the desire that South Korea put this unfortunate business behind it as soon as possible.
Support for military retaliation appears confined to those too old to fight. Even the rather mild measures that the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announced on Monday ? which included the drastic reduction of inter-Korean trade and resumption of the propaganda war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 have caused widespread hand-wringing.
The general reluctance to take the North Koreans to task can be partly attributed to a rational apprehension of the military realities. No one here needs to be reminded that Kim Jong-il could bomb Seoul flat even without using his new nuclear capacity. And in a country where all fit young men must spend two years in the military, “chicken hawks” are much harder to come by than in America.
But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are also at work. By this I do not mean only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Korean War and its manifold horrors. Up until the late 1980s, right-wing governments resorted to North Korea scares so often that many people now refuse to believe any stories about the regime, no matter how overwhelming the evidence. If President Lee thought he could allay doubts with an especially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sinking, he was mistaken. Left-wing newspapers now accuse him of postponing the announcement of the investigation’s results to exert maximum influence on next week’s regional elections.
It would be unfair to characterize these skeptics as pro-Pyongyang, but there is more sympathy for North Korea here than foreigners commonly realize. As a university student in West Berlin in the 1980s, I had a hard time finding even a Marxist with anything nice to say about East Germany. In South Korea, however, the North’s human rights abuses are routinely shrugged off with reference to its supposedly superior nationalist credentials. One often hears, for example, the mistaken claim that Mr. Kim’s father, Kim Il-sung, purged his republic of former Japanese collaborators, in alleged contrast to the morally tainted South.
Sympathy for Pyongyang is especially widespread in the peninsula’s chronically disgruntled southwest, and not just because this farming region profits whenever food aid is sent to the North. Gwangju, the largest city in the region, just commemorated the 30th anniversary of a brutal government massacre of civilian demonstrators, many of whom were defamed in the official news media of the time as North Korean agents.
South Korean nationalism is something quite different from the patriotism toward the state that Americans feel. Identification with the Korean race is strong, while that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weak. (Kim Jong-il has a distinct advantage here: his subjects are more likely to equate their state with the race itself.) Thus few South Koreans feel personally affected by the torpedo attack.
Besides, Koreans in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tend to cherish the myth that of all peoples in the world, they are the least inclined to premeditated evil. The sinking of the Cheonan is widely viewed here as an almost spontaneous byproduct of inter-Korean tension ? a regrettable aberration that should not be made too much of. The left attributes the recent increase of tension to President Lee’s rejection of his predecessors’ accommodationist Sunshine Policy. Yet even the conservative news media talk of the attack in terms of an “error” that the North should own up to, not a cold-blooded act. Students in my classes tend to refer to the sinking as an “accident.”
This urge to give the North Koreans the benefit of the doubt is in marked contrast to the public fury that erupted after the killings of two South Korean schoolgirls by an American military vehicle in 2002; it was widely claimed that the Yankees murdered them callously. During the street protests against American beef imports in the wake of a mad cow disease scare in 2008, posters of a child-poisoning Uncle Sam were all the rage. It is illuminating to compare those two anti-American frenzies with the small and geriatric protests against Pyongyang that have taken place in Seoul in recent weeks.
Such are the unique circumstances under which President Lee has tried to marshal a firm and unified response to the North’s latest provocation. So far he has done an excellent job, conveying just the right mixture of resolve and restraint. Where American presidents tend to personalize conflict with foreign powers, Mr. Lee refrained from explicitly blaming Kim Jong-il for the sinking; this may make it a little easier for the dictator to issue an apology without losing face.
Even as the North threatens “all-out war,” the Obama administration would do well to emulate the South Korean leader. It should be mindful enough of Korean nationalism to hold back on its own rhetoric. It would be counterproductive if Washington were to look more interested in punishing North Korea than the injured party is.
B. R. Myers, th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at Dongseo University, is the author of “The Cleanest Race: How North Koreans See Themselves ? and Why It Mat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