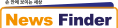3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등 금융업종의 부도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근 12년간 ‘제로(0)%’로 기록됐다.
그러나 연간 부실률은 2000년 4.7%, 2001년 6.2%에 이어 카드사태가 발생했던 2003년에는 10.2%까지 치솟았다. 2004~2009년에는 최저 1.4%에서 최고 2.9%를 보였으나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폭등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률은 부도 뿐 아니라 인가취소, 합병, 해산, 매각,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부실 발생 업체 수를 근거로 추산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비금융업종의 ‘부실률’(워크아웃을 포함한 광의의 부도율)이 5% 이내에서 완만하게 오르내린 것과는 달리 금융업종의 부실률은 카드사태와 같은 신용 위험 발생시 급격히 올라가는 특징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됐다.
한신평 심해린 애널리스트는 “금융업은 업종 특성상 시스템 위기 상황에서 업종 전반이 동시 다발적으로 신용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충격 유발 가능성은 금융업종이 비금융업종에 비해 훨씬 높다”고 말했다.
국내외에서 대형 악재가 발생해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위기에 처할 경우 정부도 모든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대신, 선별적인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연쇄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에 발생한 저축대부조합(S&L) 사태,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연쇄부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중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어 금융업에 대한 이런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은행들이 부도를 맞았다.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도난 곳도 있다”며 “현재 은행들은 부도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았지만 유럽 재정위기에 수익성이 떨어지고 방만한 자산운용이나 위험한 투자가 겹치면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재무담당 연구위원도 “일반 기업에 비해 금융업은 서로 연결성이 강해 1∼2개 무너지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며 “올해는 대외변수들과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업종이 문제 됐을 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부가 구제해주는 관행이 되풀이됐으나 앞으로는 원인 분석을 통해 대주주 등 당사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